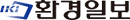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 여섯 가지다.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산출하고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고, 내년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1)에서 구체적 감축량이 도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임에도 지금까지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직·간접 규제를 적당히 혼합해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주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목표관리제와 비슷하지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국내 산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산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원하는 만큼 할당하지 않았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 사용에 대해서도 간접배출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당초 기업들이 자체 산정해 신청한 할당량이 20억 2100만 톤이었지만 실제로 할당받은 양은 15억 9800만 톤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4억2300만 톤에 해당하는 양의 과징금 12조7000억 원이 추가 부담이라는 논리다. 기업들의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기심의 발로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무한정 줄 수 없다는 점을 무시했고, 이미 배출하고 있거나 앞으로 설비 신·증설 등을 통한 배출 예정량을 기업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부가 배출권을 적게 할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 스스로 증명하지도 못한 배출량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배출권거래제 1기인 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넉넉히 받아 좋지만, 2017년 이후 감축 압력을 대비하는 ‘쇼’라는 것이다. 기업들의 요구대로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더 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가 함께 입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기업에만 돌아간다.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