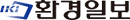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사진1]이 책은 ‘녹색세계사’로 잘 알려진 저자 클라이브 폰팅이 집필한 본격적인 20세기 세계사 개관으로 연대기적 나열 및 교과서적인 설명, 유럽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서유럽과 북미 등지 영어권 사회의 교육받은 중산층의 경험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 농민들의 경험임을 주지시킨다.
이 책이 중심에 놓고 있는 주제는 ‘진보와 야만 사이의 투쟁’이다. 유럽과 북미의 엘리트들은 과학의 발전, 자연의 정복, 생산의 증대, 민주주의의 발전,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을 통해 20세기가 ‘중단 없는 전진의 역사’가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환상은 곧 깨졌고 파시즘, 나치즘, 소련에서의 억압적 국가의 출현은 전조에 불과했다. 핵 공격과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국가의 억압이 세계 곳곳에서 목도됐다.
과학기술이 사회와 환경에 미친 파괴적 영향 역시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세계의 부는 증대됐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상위 20%가 세계 부의 80%를 향유한 반면 하위 20%는 1%도 차지하지 못했다. 폰팅은 이것이야말로 “20세기의 가장 큰 야만성”이라고 지적한다.
뿌리 깊은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주제별 서술
각각의 장은 연대순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추세를 바라보는 폰팅의 혜안을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환경’ ‘지구화’ ‘탈식민지’ ‘독재’ ‘억압’ ‘제노사이드’ 등의 제목을 단 각각의 장들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폰팅은 간명한 문체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이야기 솜씨로 20세기 전 세계의 복잡하게 얽힌 역사를 놀랍도록 깔끔하게 이해시킨다.
또 이렇게 정리된 역사는 우리가 세세한 사실관계에 얽매여 명확히 보지 못했던 추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흔히 오해되던 통념들을 뒤집기도 한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