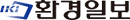화학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OECD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80% 수준으로 화학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역시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화학물질이 가정용 세제에서부터 자동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우리 정부는 세정제, 방향제, 소독제, 접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단순한 공산품으로 보기에는 안전상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더불어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늘고 있다.
화평법 제34조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한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한 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양초, 방향제 등 면적이 작고, 디자인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인테리어 상품의 경우 현재와 같은 활자크기의 표시기준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제품 겉면에 성분 명칭과 기능, 독성 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기업들은 위해성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 겉면에 ‘독성있음’ 까지 표시하는 것은 지나치며, 제품거부를 불러 중소기업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생활화학제품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세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다. 제도 유예기간이 2016년 9월까진데,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도 적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화평법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사전 예방적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환경부는 기업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제도에 적극 동참토록 더 노력해야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활동에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