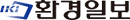이곳 저곳에서 환경경영 관련 특강과 세미나가 이어졌고, 분야 전문가들은 높은 강사료와 컨설팅비를 받으며 달려갔다. 영국의 환경경영표준 BS7750 이나 국제환경경영표준 ISO14001 인증 취득은 유행처럼 퍼졌고, 앞 다퉈 인증을 받고는 ‘친환경기업’이라고 포장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모 기업은 6개월안에 인증을 따라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착오없이(?) 수행한 사실을 자랑삼아 공개하기도 했다. 컨설팅사에 비용을 주고는 모든 일을 위임해 단기간 내 받은 인증서는 잘 보이는 곳에 걸려졌다. 그 당시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내실을 기해 조직을 강화하고, 환경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등 참의미의 환경경영은 않고 겉핥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인증 취득기업들 중 많은 수가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인증을 취득하고 그에 맞는 수준을 유지하자니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되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다.
환경경영의 선구자 역할을 한 영국의 경우, 환경성검토를 하고, 환경방침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시작하면서 인증취득까지는 최하 3년~5년이 소요된다. 더욱이 인증취득은 그 기업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즉 밑그림이 짜여 졌다는 뜻이지, 그 기업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와는 별개의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고 난 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가식적인 환경경영을 떠들 때 조용히 큰 변화를 추구한 기업도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우리나라 굴지의 모 그룹은 최고경영자의 앞선 판단과 굳은 의지에 따라 외국의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 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계열사 전 간부들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으로 시찰 보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열사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관리목표수립을 추진했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내부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는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0여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2000년대 초반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초일류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그룹으로 올라섰다. 그 까다로운 유럽의 환경기준도, 각종 환경규제강화도 그들에겐 별반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진정한 의미의 환경경영을 하기 위해 애쓰고 투자한 성과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다시금 R&D와 환경분야에의 투자를 우선순위로 줄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 21세기가 지난지도 한참이다. 지속가능이니, 사회책임주의니 하면서 겉모양만 최고수준의 기업경영을 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고, 진정 사회에 책임지려는 기업들로 거듭나길 바란다.
[제150호 2005년 1월 5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