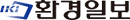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는 환경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쾌적한 환경이란 과연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야 할 실내환경에 대해 한양대 보건관리학과 이종태 교수에게 들어봤다.
[#사진1]학교가 아이들을 공격한다
“말 그대로 환경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권리’지만 실제 제대로 권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시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정작 환경권이 마련돼 있는 나라는 독일을 포함해 몇 나라 될 만큼 이례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그중 하나인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이 교수는 “그간 실내공기질보다는 대기질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해 왔지만 실내공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기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한다.
실내환경은 공간이 폐쇄돼 있어 한번 오염되면 자정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실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반 실내 환경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밀집도가 높은 데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연령이 다양하므로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미 질병에 걸린 학생도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개별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학교는 다른 실내공간에 비해 교과별 특성, 즉 미술이나 공작·과학·체육시간 등에서 비롯되는 오염원 역시 제각각인 만큼 수업별 관리도 달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간 실내공기질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건 다름 아닌 부처 간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오염된 환경이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환경부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정부 기관에서 보건·건강상의 문제를 서로 미뤄온 게 사실”이라고 전한다.
“그간 환경부에서 실내환경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외면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개개의 실내환경을 환경부가 나서서 관리하고 제한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마련된 실내공기질 기준에 대해서도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부로, 사무실에 관한 내용은 노동부로 맡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결국 부처 간 중복되는 현안에 대해 협력이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이러다 보니 얼마 전에는 폐지처리 공장에서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인근 학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히려 피해 학교에서 해당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 차원에서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점차 학교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 아이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환경문제, 과민반응 vs 짧은 망각
최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김치파동 아니면 조류독감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물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환경에 대한 솥뚜껑식 관심은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한동안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날마다 농성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됐지만 지금은 잠잠해졌죠. 실제 다이옥신의 경우 국내에서 산업화가 그리 일찍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90% 이상이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수는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그동안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이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그에 따라 정부 역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지면 언제 그런 일이 터졌냐는 듯 잠잠해 지는 게 유행인양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발생된 문제, 위험성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자파’로 인한 피해다. 아직도 인체 위해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은 데다 그간 생물학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왔지만 미국에서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추적·연구해 본 결과 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곳마다 송전선이 지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안전불감증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연히 신문에서 어린아이들이 보트를 타며 신나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을 실은 의도 역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어린이들 여러 대의 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 하나 착용하지 않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어른도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일상화됐기에 이런 사진을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에서 지난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한 것 역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서 ‘환경불감증’ 역시 깊어져만 가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