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막 손상 따른 호흡기 질환 유발, 기후변화 흐름 속 증가세 뚜렷
VOC 제어 관건···지형·대기 조건 등 고려한 권역별 구분 관리 필요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오존(O₃)을 제어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대기 속 오존의 위해성을 관측해 온 학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15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도 목소리는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오존 관리에 대한 제도적 빈틈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오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지만 언제쯤 해결책이 나올진 알 수 없다는 그림자가 짙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이날 (사)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오존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다.
오존은 산소 분자(O₂)에 원자 형태의 산소(O)가 붙은 구조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는 성질이 강하다. 체내 세포가 여기에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강한 산화력이 세포막을 파괴 또는 변형시켜 천식 등 만성 폐질환을 유발한다. 식물로 유입될 경우 광합성을 방해해 생장을 막는다.
오존은 굴뚝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는 2차 반응 생성물이다. 자동차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오염물(VOC) 등이 반응해서 생성된다. 습도, 온도, 풍속,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까다롭다.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성층권(지상 10~50km) 오존과는 달리 대류권(지상 0~10km)에 떠다니는 오존은 양면성이 있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 대기오염도 측정망 에어코리아(airkorea)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는 급증했다.
올해 5월엔 최대치를 찍었다. 환경부는 5월 오존 농도가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5월 오존 농도, 2001년 이래 최고치
이에 따라 실외 활동, 실외 학습, 자가용 이용, 스프레이·드라이클리닝·페인트칠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한다고 했다.
국민행동요령 배포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스마트폰 앱(에어코리아)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엔 해결할 숙제가 많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현재로선 정부가 손을 써도 한계가 있단 것이다.
여민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오존 농도는 지난 30여년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역별 발생 특성을 이해한 관리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는 “오존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오존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구역, 지리적 거리가 아닌 지형 분포, 대기 안정도 등을 고려해 관리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오존을 줄이려면 VOC를 줄여야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쓸지부터 갈피를 못잡고 있다”면서 “VOC는 세탁소, 주유소, 인쇄소 등 소규모 배출원이 많은 특성 때문에 관리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계절이나 기상별 대응방식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나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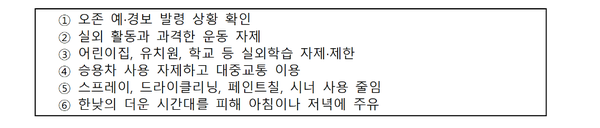
우정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람이 많은 도시 뿐만 아니라 전원 지역의 오염 또한 살펴야 하는데 이는 탄소중립 준비 과정에서 강조되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연발생 VOC 관리 속수무책
이어 김조천 (사)한국대기환경학회장은 “자연에서도 VOC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수종별로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종별로 배출하는 VOC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수종이 심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종범 강원대학교 교수는 “나무에서 나오는 VOC에 대한 실제 배출계수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복잡한 국면에서 ‘기후변화’라는 좋지 않은 변수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의 대기 흐름은 약해지고, 이로 인해 높아진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결국 오존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고됐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는 “오존은 미세먼지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며 “앞으로 대두될 문제를 감안하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숙제”라고 강조했다.

